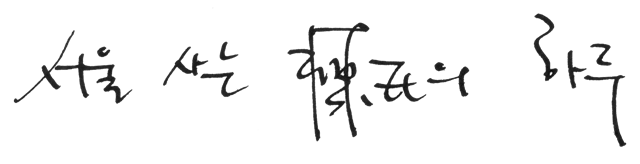어렵다 어렵다 하던데 어디가 어려운지 모르겠고, 감동적이다 감동적이다 하던데 어느 부분에서 감동을 느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 영상미가 끝내준다 하던데 그 끝내주는 장면을 찾다 보니 영화는 끝났더라. 이야기 구조도 마음에 안 들고, 하나의 인터뷰와 두 시공을 엮어 서사를 이끄는 것도 별로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의 놀라운 점을 찾는다면, 그 복잡한 과학이론을 옆 동네 아저씨와 자동차 엔진오일 교체시기를 말하듯 자연스럽게 풀어 놓았고, 3시간 남짓의 상영시간을 (너무) 지루하지 않게 꾸몄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의 놀라운 점을 찾는다면, 그 복잡한 과학이론을 옆 동네 아저씨와 자동차 엔진오일 교체시기를 말하듯 자연스럽게 풀어 놓았고, 3시간 남짓의 상영시간을 (너무) 지루하지 않게 꾸몄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두 가지 놀라온 점 중 과학이론 이야기는 ‘허풍’없는 표현에는 박수를 보내고 싶었다. 대부분의 Sci-Fi 영화나 이야기는 이상하게 과학이 무참히 밟히고 ‘극적인 전개’와 ‘이야기의 재미’를 위해 희생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인터스텔라는 달랐다. 과학이론을 온전하게 보존하면서 상상력과 극적 재미를 유지하였다.
극장을 떠나던 한 관객은 ‘이건 판타지네’라고 정리하던데, 그건 과학이었고 - 그것도 과학을 잘 이해한 사람이 잘 만든 영화였다. 우리는 3차원에 온 몸이 묶여 사는 사람들이라서 상위 차원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모르지만, 만약 우리 3차원에 ‘시간’이라는 것을 다차원의 한 요소로 집어 넣는다면 (아마도 그럴 것이다), 쿠퍼의 시간 열람이라는 설정은 과학적으로도 허풍이 없는 이론적 ‘사실’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시간의 상대성은 일반적이어서 달리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난 머피라는 캐릭터가 시종 마음에 들지 않았다. 앤 해서웨이는 나이를 먹지 않더라. 연기도 (당연히) 잘 하더라.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 하며 감정에 북받치는 지적인 여성의 모습은 아직도 잔상으로 남는다. 극장을 나서면서 난 문득, 그 각지고 모던한 변신 로봇을 가지고 싶어졌다, 유머 70%로.
나의 휴일 반나절 낭비했다는 생각도 들었다. 크리스토퍼 놀란의 열렬한 팬으로서 전반적으로 실망스러운 영화였다. 하지만, 같은 주제로 다른 누군가가 영화를 만든다면 크리스토퍼 놀란보다 잘 만들지는 못 할 것이다. 누가 이런 심오한 주제 속에서 ‘하늘을 보며 꿈을 꾸던 시절’을 관객에게 상기시켜 주겠는가?
 인터스텔라는 궁극적으로 ‘이성’과 ‘감성’ 사이에 흔들리는 ‘직관’에 관한 이야기이고, 믿음과 사랑에 관한 이야기이다. 아버지 쿠퍼와 딸 쿠퍼, 아버지 브랜드와 딸 브랜드, 아버지 브랜드와 아버지 쿠퍼, 딸 쿠퍼와 아버지 브랜드, 그리고 아버지 쿠퍼와 딸 브랜드가 그렇게 이어지고 서로를 그리워 하고 상처받으며, 함께 마음을 쓰는 영화이다. 이성적인 판단은 누군가의 감정적인 왜곡으로 실패하게 되고, 사랑을 기반한 그래서 믿음이 되는 감성적인 선택은 차가운 이성보다 나은 결과를 가져다 주도록 놀란 형제는 설정하였다. 그런 메시지가 스크린에 투영되었다.
인터스텔라는 궁극적으로 ‘이성’과 ‘감성’ 사이에 흔들리는 ‘직관’에 관한 이야기이고, 믿음과 사랑에 관한 이야기이다. 아버지 쿠퍼와 딸 쿠퍼, 아버지 브랜드와 딸 브랜드, 아버지 브랜드와 아버지 쿠퍼, 딸 쿠퍼와 아버지 브랜드, 그리고 아버지 쿠퍼와 딸 브랜드가 그렇게 이어지고 서로를 그리워 하고 상처받으며, 함께 마음을 쓰는 영화이다. 이성적인 판단은 누군가의 감정적인 왜곡으로 실패하게 되고, 사랑을 기반한 그래서 믿음이 되는 감성적인 선택은 차가운 이성보다 나은 결과를 가져다 주도록 놀란 형제는 설정하였다. 그런 메시지가 스크린에 투영되었다.